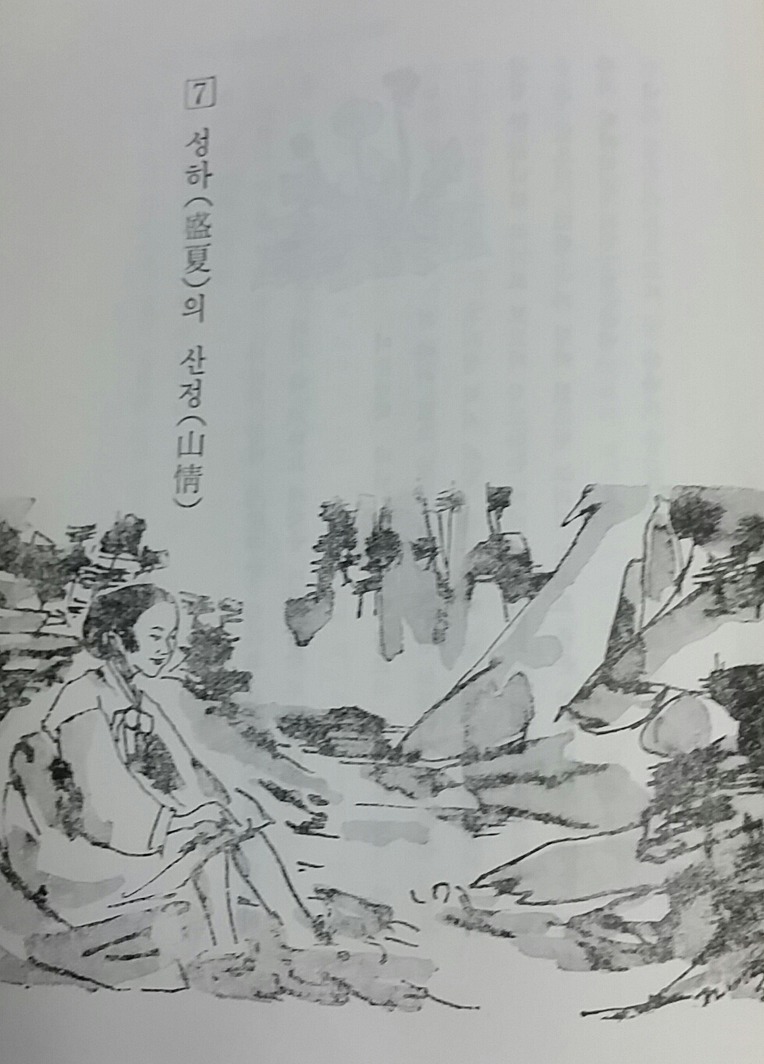
성하(盛夏)의 산정(山情)
1963. 9. 10
하촌(霞村) 남용우(南龍祐)
아내와 함께 回龍寺를 찾기로 한 것은 여름방학이 거진 다 지나고 개학을 며칠 앞둔 무렵이었다.
여름방학 내내 거의 매일 학교에 나가 살았다. 변화의 맛이 없고 같은 일을 자꾸만 되풀이해야 하는 원고정리엔 역시 제일 좋은 곳이 학교다. 넓직한 곳이라 시원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학교라는 데에 배어 있는 그 배움의 분위기에 젖을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집에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좁은 집의 안방 하나를 혼자서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집을 나옴으로써 방 하나가 빌 것이요, 따라서 집안 식구들이 좀 널찍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무더운 여름에 사람 하나의 체온을 줄이는 것만도 가족들의 보다 나은 여름 생활을 위하여 적지 않은 이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는 이것이 모두 돈 없는 사람이 가족들을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보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릉 뒷산에서 떠오는 약물로 쌀을 씻어 지은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만도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이 판에 피서란 애당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허지만 방학 중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끝에 그 목적지로 결정한 곳이 바로 의정부의 회룡사였다.
그러나 다 큰 위의 세 놈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가기 싫다는 이유로, 그리고 맨 끝의 꼬마는
『오늘은 집에서 숙제 정리를 해야겠어요.』
하며 떨어졌으므로, 결국 일행은 나와 아내뿐이 된 셈이다.
회룡사는 집의 어머님께서 정성껏 다니시는 절이다. 그러니까 벌써 20여년 전, 나와 내 아우 봉우가 왜정하에 각각 징용을 나가고 병정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부처님께 우리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며 다니기 시작하신 절이 이 회룡사인 것이다. 어머님의 정성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B29의 공습을 받던 그 무서운 땅을 용케 빠져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온 후에도 어머님은 계속 부처님을 섬기고 절에 다니시는 것이다. 칠순이 훨씬 넘으신 오늘날도, 꼬부라진 허리를 지팡이에 의탁하고 지성껏 회룡사를 찾으신다.
이번만 해도 백중날 불공이 있다고 하여 벌써 며칠 전에 회룡사에 가셨으니, 우리의 이번 방문은 회룡사 구경뿐이 아니라 먼저 가 계신 어머님을 뵙기도 겸한 일이었다.
「회룡채석장입구」라고 써 붙인 곳에서 버스를 내린 것은 약 열한 시쯤 된 때였다.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 약 50분쯤 걸으면 회룡사에 닿는 것이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여름의 뜨거운 햇볕, 나직이 하늘을 타고 흐르는 뭉게구름, 싱싱하게 푸르기만 한 사방의 산, 넓은 논에 물결치는 퍼런 벼, 때때로 만나는 흰 옷 입은 소박한 농촌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낯익은 미군부대 캠프의 모습 ⎯ 이러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서울살림의 어려움을 잊고 가슴 속에 여름의 詩情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초입에 지나지 않는다. 몇 해 전에 눈익혀 본 대문이 다 쓰러진 초가집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回龍洞의 커다란 느티나무 하나를 지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수록 佳境이 벌어지는 것이다. 바른쪽으론 溪谷에 옥 같은 물이 흐르고, 왼쪽엔 푸른 이끼가 낀 벼랑이 솟아있다. 올라갈수록 공기는 점점 맑아지고 산과 물이 신비로와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절을 찾을 적마다 느끼는 기분이요, 바로 이것이 절 즉 절이 지키고 있는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深奧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이런 때인 것이다. 이리하여 절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깊은 산속일수록 더 마음에 든다. 회룡사는 그리 깊은 산속도 아니면서 바로 절 앞에 닿기 전에는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묘한 데가 있다. 바로 그 앞에 닿아서야, 「아, 여기 있었구나!」하는 경탄과 더불어 발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어느덧 우리는 회룡사에 닿았다. 六·二五사변중에 온통 타 없어져, 그 후에 아이러니칼하게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서양 나라 미국군대의 원조를 받아 간신히 지은 것이다. 웅장할 수는 없었지만, 입구에 있는 蓮池라든지 얌전히 가꾸어 놓은 화단의 玉簪花랑 진홍빛 깨꽃이랑 모두가 청아하고 아담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말끔히 쓸어 놓은 마당, 윤이 나도록 잘 가꾼 법당 ⎯ 比丘尼들만이 사는 곳이라 이처럼 깨끗한 것일까. 사방 산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요란하고, 불당에는 젊은 비구니의 경 읽는 맑은 목소리가 흐른다. 조심조심 불어오는 산바람에 흔들려 처마 끝의 풍경이 덩그렁 거린다.
행여나 이 그윽함을 깨뜨릴까 두려워 조용조용히 발길을 옮겨 불당으로 갔다. 불당을 들여다보니 어머님께서 열심히 염불을 외우며 연거푸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리고 계시다. 자식 손자 소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정성껏 치성을 드리고 계신 어머님의 영혼은 필경 부처님과 함께 극락세계를 오가고 있었을 것이다.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별안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왔습니다.」하고 말했다. 뜻밖에 방문을 받은 어머니는 無想無念 부처님의 세계를 방황하던 중이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무척 놀라신다.
그러나 어머님은 곧 地上의 우리 어머니가 되셔, 반가와 어쩔 줄을 모르신다. 며칠 떨어졌다 다시 만나 반갑기도 했지만, 당신이 그처럼 받드는 회룡사에서 뜻밖에 만난 것이 더욱 기쁘셨던 것이다. 任씨 스님도 안에서 나와 우리를 반겨 주셨다. 나이 이미 칠십이 넘은 임씨 스님은 어머님과는 새색시 때부터 친히 지내는 사이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나의 先親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도 스님은 잘 알고 계시다. 늙은 스님의 주름진 얼굴에서 그 눈에 비쳤을 파란 많았던 아버지의 생애를 훔쳐보는 것이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므로 본당 마루에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비구니들 사이에 끼어 식사를 했다. 오이지, 김치, 된장..... 기름 끼라고는 하나도 없는 반찬이 라서가 아니라, 온통 비구니들이 있는 속에서 식사를 하자니 모두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도무지 입에 밥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나를 보는 그들의 눈이 경멸의 눈으로도 또는 속세 사람을 그리워하는 눈으로도 보인다. 이때에 나는 무엄하게도, 일본 宮室에서 일평생 시집갈 희망도 없이 같은 여성들만의 사이에 끼어 일하던 어느 侍女가 그 답답한 궁내 생활을 못 이겨 발광한 끝에 아무나 칠 수 없는 궁내의 鐘을 마구 치고 그만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했다.
이리하여 나는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갈을 놓고 몸을 일으켰다.
바깥 공기는 한없이 맑았다. 점점이 흰 구름이 흐르는 하늘 아래, 앞에 바라보이는 산등어리를 스치며 헬리콥터가 점잖게 날은다.
나는 다시 또 다른 부처님을 모셨다는 별당으로 올라가 아내를 따라 부처님께 절을 하였다. 불교의 교리도 잘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이렇게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순간에는, 그저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勸善懲惡이 불교의 宗旨의 하나라면, 우리 한국사람 속에 뿌리박고 있는 생리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은가.
『착한 사람이 돼야 해. 나쁜 짓을 하면 안되.』
우리는 이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부터, 이 가르침을 받고 자란 것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露語나 영어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들은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별당 마루 끝에 앉아, 임씨 스님께서 갖다 주신 회룡사의 역사책을 펴 보았다.
회룡사는 지금으로부터 一천 二백 八一년 전 신라 神文王 二년에, 그 당시 이름 높았던 義湘大師가 창건한 절이라고 전한다. 원래는 이름이 法性寺였는데, 李太祖가 임금이 되기 전 이근처를 지나다가 절에 있던 無學大師를 만나려고 들른 일이 있어 龍駕를 돌렸다고 하여 그 후부터 回龍寺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창건 이후 여러 번 重刱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로 중창한 분이, 仁祖反正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李貴의 딸인 禮順아씨라고 한다.
가지가지의 역사를 보고 또는 직접 겪은 회룡사의 오늘날 주지는 비구니 도준(道準)스님 이시다.
이일 저 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몇 시간 동안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성껏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아끼고 섬기는 그 산중에서 우리는 俗塵을 훌훌 다 털어 버리고 다시 귀로에 올랐다.
어머님은 백중날 불공 때문에 며칠 더 계신다고 한다. 나오시지 말라 고 해도 막무가네 입구 연못까지 나와 우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다.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손을 휘두르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위 모퉁이를 돌아섰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우리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일을 걱정해야 했다. 먹고, 입고, 씻고, 닦고 그리고 배우고 일하고 .... 산다는 것은 무척 힘 드는 일이다. 「글쎄, 어떻게 될 테지.」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털어 버리고 만다.
『잠깐 앉았다 갈까요.』
한창 내려오다가 아내는 계곡의 맑은 물을 보고 그대로 갈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수정 같은 차돌위에 앉아 옥 같은 물에 발을 담갔다. 하늘에는 새들이 노래하며 날고, 우거진 숲은 마냥 푸르기만 하다. 여기서 나는 조금 전에 읽은 회룡사 十三景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혼자 마음속으로 읊어 보는 것이다.
회룡사 십삼경(十三景)
지은이 未詳
발굴 霞村 南龍祐(1922~1975)
一. 봄산에 두견 소리 (春山聞鵑)
꽃보려 뫼오르고 뻐꾹소리 앉아듣세
귀촉도 돌아못가 천추한 풀길없어
이산천 울어예노니 두견새라 하더라.
二. 연못 위에 비소리(池塘聽雨)
가지에 바람차고 연못위에 비쏟는다
큰닢에 덧는소리 묘법연화 설항인가
절밖에 전하는 소리 알길없어 하노라.
三. 저문 날의 종소리(煙寺暮種)
오늘도 저녁연기 옛가람을 싸고돌제
은은한 종경소리 홀로 앉아 듣는마음
끝없는 인간수심이 자로 사라지더다.
四. 동령에 솟는 달빛(東嶺皓月)
동령에 솟는달님 언약한 듯 찾아오네
정다운 벗님같이 서로대해 묵묵이라
웃는 듯 퍼지는광채 내맘비쳐 주더라.
五. 나려 찟는 긴 폭포(散珠長瀑)
가는길 험하다고 시냇물이 분노하며
소리쳐 닫는걸음 파란곡절 장관이라
구슬을 쏟고뿌리며 눈보라도 뿜더라.
六. 늦가을의 단풍(九秋丹椿)
본대 화려강산 금상첨화 수논양을
잎잎이 꽃이 되어 가지가지 방창이라
이러한 고운 풍경은 다시 없어....
七. 깊은 겨울의 눈 경치(隆冬雪景)
한치위 겪어갈제 따에 가득 육화로다
가지에 얹힌모양 그도 또한 경개롭다
추잡한 티끌세상이 옥경된듯 하여라.
八. 여름날의 우거진 숲(盛夏綠陰)
낙화촌 다지나니 녹음방초 좋은때라
새울고 물이흘러 시원하기 그지없네
한여름 이곳진미를 아는사람 적더라.
九 . 서산위에 지는 해(西山落照)
동에서 오신햇님 우주만유 기르시고
정토로 가실적에 다시방광 낙조라네
출몰에 거룩한상이 산주불타 같소라.
一O. 안개의 천변만화(霧張浮島)
폭풍우 몰아오다 문득병해 큰 바다라
천봉은 뜬섬되고 촌락점정 어주로다,
높이서 바라다보니 아득아득 하여라.
十一. 골골이 맑은 못(谷谷澄潭)
골골이 물의장엄 개울되고 물이되어
해달이 잠겨가고 천광운영 떠도나니
이산에 이물이있어 명승지가 되니라.
十二. 옛 탑에 푸른 이끼(古塔蒼苔)
검버섯 돋은날에 풍우겪은 몸이로다
천추 한자리에 부동존불 본을받아
오가는 사람들보고 웃는모양 같더라.
十三. 절로 생긴 바위굴(天然石窟)
태고적 원시족이 몇대사던 굴아닌가
또한때 어느스님 수도하던 굴아닌가
지금에 지나는사람 범의굴로 알더라.
벌써 눈앞의 우뚝한 서산에 해가 기울어지려 했다.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새 울고 물이 흘러 시원하기 그지없는」 그 계곡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후 우리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르릉 발동을 건 버스가 차츰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 삼켜지면서 힘차게 서울로 달렸다.
- 끝 -
→ 회룡사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11
'霞村 南龍祐 隨筆' 카테고리의 다른 글
| 霞村 隨筆(7) 애제상(愛弟想) (0) | 2022.03.12 |
|---|---|
| 霞村 隨筆(6) 쿠오바디스와 그 周邊 (0) | 2022.03.01 |
| 霞村 隨筆(4) 크리스마스 카드와 육군 중위 (0) | 2019.12.11 |
| 霞村 隨筆(3) 하촌(霞村)이라는 아호(雅號) (0) | 2018.12.17 |
| 霞村 隨筆(2) 효자송(孝子頌) (0) | 2018.11.16 |